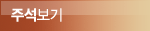소장처 고문서 특징
- 홈
- 소장 고문서
- 소장처 고문서 특징
 註2)
본서에서 언급하는 밀성박씨는 박언침의 8세손 朴彦孚를 중조로 하고 있다.
註2)
본서에서 언급하는 밀성박씨는 박언침의 8세손 朴彦孚를 중조로 하고 있다.
 註3)
고려말 신흥사대부에 속하는 朴宜中(大司成, 檢校參贊議政府事)은 전라도 김제에 이주하였고, 세조공신인 朴仲孫은 훈구파로 성장하였으며, 점필재 김종직의 외가인 朴弘信 一家와 朴永均, 朴世均(桃隱 朴文彬, 迂拙子 朴漢柱, 菊潭 朴壽春 家系) 형제 一家는 재지사족이었다. 밀성박씨는 고려말 조선초기에 걸쳐 京派와 鄕派로 나누어졌고, 재지세력은 吏族과 士族으로 구분되어 갔다.
註3)
고려말 신흥사대부에 속하는 朴宜中(大司成, 檢校參贊議政府事)은 전라도 김제에 이주하였고, 세조공신인 朴仲孫은 훈구파로 성장하였으며, 점필재 김종직의 외가인 朴弘信 一家와 朴永均, 朴世均(桃隱 朴文彬, 迂拙子 朴漢柱, 菊潭 朴壽春 家系) 형제 一家는 재지사족이었다. 밀성박씨는 고려말 조선초기에 걸쳐 京派와 鄕派로 나누어졌고, 재지세력은 吏族과 士族으로 구분되어 갔다.
 註4)
註4)

 註5)
이들과 더불어 八隱의 한 사람으로 칭송되고 있다. 또한 朝鮮開國의 元勳인 裵克廉이 그의 처남이기도 하였다.
註5)
이들과 더불어 八隱의 한 사람으로 칭송되고 있다. 또한 朝鮮開國의 元勳인 裵克廉이 그의 처남이기도 하였다.
 註6)
밀양의 德南書院과 新溪書院, 龍岡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은선생문집이 있다.
註6)
밀양의 德南書院과 新溪書院, 龍岡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송은선생문집이 있다.
 註7)
註7)


 註8)
註8)
 註9)
이주 배경에는 신촌이 春堂 卞仲良(1352~1398)과 春亭 卞季良(1369~1430)의 우거지와 인접한 곳이었던 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박소는 이곳에서 이들과 강학활동을 하였으며 향풍교화를 위해 조직된 龜齡洞案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註9)
이주 배경에는 신촌이 春堂 卞仲良(1352~1398)과 春亭 卞季良(1369~1430)의 우거지와 인접한 곳이었던 점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박소는 이곳에서 이들과 강학활동을 하였으며 향풍교화를 위해 조직된 龜齡洞案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註10)
註10)



 註11)
1598년에는 신기리에 새로이 종가를 신축하는 등 밀성박씨 종가의 기틀을 새로이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박이눌의 가계는 그 이후, 安東의 豊山金氏(金奉祖 家), 豊山柳氏(柳雲龍 家), 鵝州申氏(申悅道 家), 昌寧成氏(成汝信 家), 靈山辛氏(辛礎 家) 등과 連婚하면서 在地士族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註11)
1598년에는 신기리에 새로이 종가를 신축하는 등 밀성박씨 종가의 기틀을 새로이 다지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박이눌의 가계는 그 이후, 安東의 豊山金氏(金奉祖 家), 豊山柳氏(柳雲龍 家), 鵝州申氏(申悅道 家), 昌寧成氏(成汝信 家), 靈山辛氏(辛礎 家) 등과 連婚하면서 在地士族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다.

 註12)
1615년의 분재기는 임진왜란 이후 박이겸을 비롯한 4남매간의 분재에 있어 박범이 부친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록이며, 1636년의 분재기는 박범의 처 엄씨남매간의 분재에 박범이 처를 대신하여 노비, 전답을 분급받는 내용이다. 이들 분재기에 의하면 치산이재에 의한 가산의 증식과 아울러 처가, 외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가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12)
1615년의 분재기는 임진왜란 이후 박이겸을 비롯한 4남매간의 분재에 있어 박범이 부친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록이며, 1636년의 분재기는 박범의 처 엄씨남매간의 분재에 박범이 처를 대신하여 노비, 전답을 분급받는 내용이다. 이들 분재기에 의하면 치산이재에 의한 가산의 증식과 아울러 처가, 외가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가산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13)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박의중이 무과에 급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밀성박씨가에서는 박범의 軍功에 의해 2대가 추증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의중이 무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내 분위기는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註13)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박의중이 무과에 급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밀성박씨가에서는 박범의 軍功에 의해 2대가 추증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의중이 무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내 분위기는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註14)
사실, 밀성박씨에 있어 박범 이래 출사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박소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고관을 역임한 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의중이 임란이후 비록 무과이기는 하였으나 출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박의중은 급제 이후 출사하지 못했으며, 종신토록 향리에서 소요하였다. 양란 이후 무과는 萬科로 통칭되며 이미 조선 전기의 문무 양과로서의 성격에서 상당히 변질된 상태였기에
註14)
사실, 밀성박씨에 있어 박범 이래 출사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박소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고관을 역임한 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의중이 임란이후 비록 무과이기는 하였으나 출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박의중은 급제 이후 출사하지 못했으며, 종신토록 향리에서 소요하였다. 양란 이후 무과는 萬科로 통칭되며 이미 조선 전기의 문무 양과로서의 성격에서 상당히 변질된 상태였기에
 註15)
그의 출사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성박씨는 그의 무과급제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밀양 향중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註15)
그의 출사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성박씨는 그의 무과급제를 계기로 기존의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밀양 향중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註16)
註16)
 註17)
박증엽과 박함 부자 양대는 밀양 향중에서 명망이 높은 학자였다. 임란의 회오리 속에 밀성박씨 종중의 구심체 역할을 하던 모선정이 소실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하다가 박증엽 당대에 이르러 중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증엽은 밀성박씨 종중을 결집하여 모선정이 있던 옛터에 다시 재실을 중수하였던 것이다. 이는 밀성박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밀성박씨의 주요 사회적 활동은 모선정과 덕남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모선정은 덕남서원의 창건이 있기 전까지 밀성박씨의 구심체로서 박수견을 중심으로 한 종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註17)
박증엽과 박함 부자 양대는 밀양 향중에서 명망이 높은 학자였다. 임란의 회오리 속에 밀성박씨 종중의 구심체 역할을 하던 모선정이 소실되고 말았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재건되지 못하다가 박증엽 당대에 이르러 중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증엽은 밀성박씨 종중을 결집하여 모선정이 있던 옛터에 다시 재실을 중수하였던 것이다. 이는 밀성박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밀성박씨의 주요 사회적 활동은 모선정과 덕남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모선정은 덕남서원의 창건이 있기 전까지 밀성박씨의 구심체로서 박수견을 중심으로 한 종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註18)
이들의 양자로 인해 현전하는 가전 문서에는 이들 양대 외에도 여러 족친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서가 상당수 확인된다.
註18)
이들의 양자로 인해 현전하는 가전 문서에는 이들 양대 외에도 여러 족친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문서가 상당수 확인된다.
|
세대 |
이름 |
분묘위치 |
비 고 |
세대 |
이름 |
분묘위치 |
비 고 |
|
8 |
朴翊 |
淸道面 華山 |
|
17 |
朴文經 |
儉岩里 |
沙道谷 |
|
9 |
朴昭 |
淸道面 華山 |
失傳(說壇享祀) |
18 |
朴宜中 |
道老浦 |
|
|
10 |
朴仲蕃 |
新湖里 |
慕先山 |
19 |
朴雲翼 |
新基 |
|
|
11 |
朴孝順 |
新湖里 |
慕先山 |
20 |
朴增曄 |
道老浦 |
|
|
12 |
朴守堅 |
新湖里 |
慕先山 |
21 |
朴諴 |
儉岩里 |
沙道谷 |
|
13 |
朴芃 |
魯禮山 |
|
22 |
朴鼎淳 |
新湖里 |
|
|
14 |
朴承綸 |
魯禮山 |
|
23 |
朴世宇 |
新湖里 |
|
|
15 |
朴以謙 |
儉岩里 |
沙道谷 |
24 |
朴魯慶 |
新基 |
|
|
16 |
朴範 |
儉岩里 |
沙道谷 |
25 |
朴漢佐 |
大龜齡 |
|

 註19)
註19)
 註20)
박익의 영정을 別廟에 移安 하였다가 1933년에는 모선정 후편에 영정각을 건립하고 이안 하였다고 한다. 한편, 현재 종가의 구역내에는 朴以謙을 향사하기 위한 新溪齋가 남아 있다.
註20)
박익의 영정을 別廟에 移安 하였다가 1933년에는 모선정 후편에 영정각을 건립하고 이안 하였다고 한다. 한편, 현재 종가의 구역내에는 朴以謙을 향사하기 위한 新溪齋가 남아 있다.
 註21)
본 신계재는 덕남서원이 훼철되는 시점에 신계재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덕남서원의 건물을 그대로 이건하여 중수하였다고 한다.
註21)
본 신계재는 덕남서원이 훼철되는 시점에 신계재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덕남서원의 건물을 그대로 이건하여 중수하였다고 한다.
 註22)
註22)

 註23)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고문서의 분류와 정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註23)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고문서의 분류와 정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註24)
기존 자료집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였다.
註24)
기존 자료집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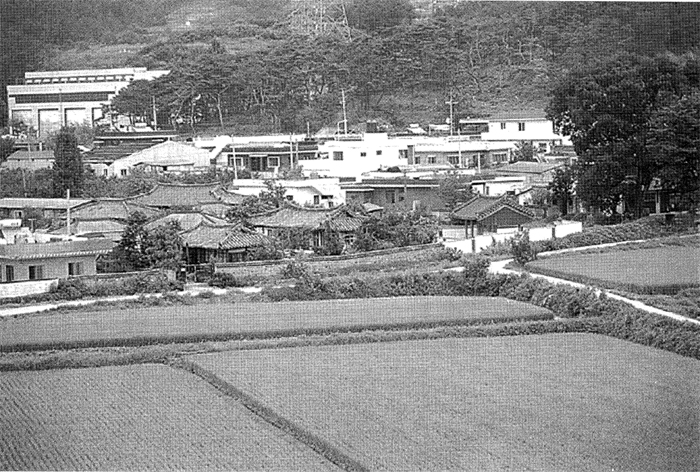
 註25)
이 외에는 朴承綸과 朴以謙을 각각 戶曹參判과 工曹參議로 추증하는 고신이 있다. 이들의 추증에는 박범이 군공으로 2대가 추증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증고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추증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1687년(肅宗13)에 박의중을 兼司僕에서 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은 박의중의 행적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본 고신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그가 실직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註25)
이 외에는 朴承綸과 朴以謙을 각각 戶曹參判과 工曹參議로 추증하는 고신이 있다. 이들의 추증에는 박범이 군공으로 2대가 추증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증고신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추증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렵다. 1687년(肅宗13)에 박의중을 兼司僕에서 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는 고신은 박의중의 행적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본 고신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그가 실직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註26)
자료의 대부분은 여타 문중소장 소지자료가 그러하듯이 산송과 관련한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노비 및 魚梁 소유권과 관련한 쟁송문서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소지류 자료는 대부분이 19세기에 형성된 자료이고 18세기에 형성된 자료는 3건에 불과하다. 18세기 소지 3건은 산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박함과 박정순이다. 19세기 소지에 등장하는 쟁송 주체는 박숭목과 박희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박한좌, 박숭목 부자 양대에 걸친 양자 사실로 인해 쟁송 주체는 門長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중 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지류 자료에 나타난 쟁송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자료의 현황은 【표-2】와 같다.
註26)
자료의 대부분은 여타 문중소장 소지자료가 그러하듯이 산송과 관련한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는 노비 및 魚梁 소유권과 관련한 쟁송문서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소지류 자료는 대부분이 19세기에 형성된 자료이고 18세기에 형성된 자료는 3건에 불과하다. 18세기 소지 3건은 산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를 주도한 인물은 박함과 박정순이다. 19세기 소지에 등장하는 쟁송 주체는 박숭목과 박희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박한좌, 박숭목 부자 양대에 걸친 양자 사실로 인해 쟁송 주체는 門長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종중 구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지류 자료에 나타난 쟁송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자료의 현황은 【표-2】와 같다.
|
구 분 |
관 련 자 료 |
비 고 |
|
|
奴婢爭訟 |
4번 |
|
|
|
魚梁爭訟 |
9번~12번 |
族親間 爭訟 |
|
|
山訟 |
安鍾河 關聯 |
15번~45번 |
1894년.1895년 |
|
기타 |
1번, 2번, 5번~8번 |
|
|
|
松楸犯斫 |
46번, 3번 |
犯斫(46번), 斥賣(3번) |
|
|
其他 |
13번,14번 |
族親間 爭訟 等 |
|
 註27)
특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에 형성된 소지 1번과 2번은 산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소지 1은 박증엽대에 이룩된 모선정의 중수 사실과 아울러 그 후 아들 박함이 모선정 및 모선산의 분묘와 관련한 쟁송을 처리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소지 2는 沙道谷에 위치한 선산에 대한 투장 사실을 정소하는 내용이다. 이들 두 소지는 모선정과 사도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밀성박씨 종중의 선산에 대한 대처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註27)
특징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8세기에 형성된 소지 1번과 2번은 산송과 관련한 내용이다. 소지 1은 박증엽대에 이룩된 모선정의 중수 사실과 아울러 그 후 아들 박함이 모선정 및 모선산의 분묘와 관련한 쟁송을 처리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소지 2는 沙道谷에 위치한 선산에 대한 투장 사실을 정소하는 내용이다. 이들 두 소지는 모선정과 사도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밀성박씨 종중의 선산에 대한 대처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註28)
註28)

 註29)
박숭목은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근거의 제시를 통한 명확한 이굴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일동안 이굴하지 않을 경우 관력을 동원해 이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숭목은 밀양관의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박가에 대한 징치를 강력하게 의뢰하고 있다.
註29)
박숭목은 이러한 현실에서 관련 근거의 제시를 통한 명확한 이굴의 이행을 요청하였다. 그가 제시한 근거는 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일동안 이굴하지 않을 경우 관력을 동원해 이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숭목은 밀양관의 도움을 요청함과 아울러 박가에 대한 징치를 강력하게 의뢰하고 있다.
 註30)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깊어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용이하므로 호적류로 일괄 분류하였다.
註30)
그러나 호구단자와 준호구가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깊어 함께 분류하는 것이 이용에 용이하므로 호적류로 일괄 분류하였다.
 註31)
개명사항을 정리한 결과 적어도 2회 이상의 개명이 있었으며 빈번한 경우에는 총 5회에 걸친 개명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註31)
개명사항을 정리한 결과 적어도 2회 이상의 개명이 있었으며 빈번한 경우에는 총 5회에 걸친 개명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註32)
이들 개명내역을 정리하면 【표-3】와 같다.
註32)
이들 개명내역을 정리하면 【표-3】와 같다.
|
항열 |
이름 |
개 명 사 항 |
비고 |
|
20 |
朴增曄 |
◦應夢(1702, 15歲)→松茂(1705, 18歲) →增曄(1711, 24歲)→朴增蓍·增耆(1738,51歲)→朴增曄 |
朴增蓍=朴增耆 5회 |
|
21 |
朴諴 |
◦聖東(1720, 7歲)→諴(1735,22歲) |
2회 |
|
朴諲 |
◦衛東(1720, 3歲)→諲(1735,18歲) |
2회 |
|
|
朴燮 |
◦俊東(1735,8歲)→燮(1741,14歲) |
2회 |
|
|
22 |
朴鼎淳 |
◦何懼(1741,11歲)→鼎淳(1759,29歲) |
2회 |
|
朴鼎玉 |
◦無懼(1741,8歲)→鼎玉(1759,26歲) |
2회 |
|
|
朴鼎臣 |
◦多懼(1744,5歲)→鼎臣(1759,20歲) |
2회 |
|
|
朴鼎命 |
◦最貴(1762,14歲)→鼎明(1771,23歲)→鼎命(1777,25歲) |
3회 |
|
|
朴鼎禹 |
◦鳳年(1768,16歲)→鼎禹(1774,22歲) |
2회 |
|
|
23 |
朴世宇 |
◦宗根(1783,17歲)→世宗→世宇(1804,38歲) |
3회 |
|
24 |
朴魯慶 |
◦魯慶→鱗慶(1819,27歲)→魯慶→祥民(1825,33歲)→魯慶 |
5회 |
|
朴佑慶 |
◦璣慶(1819,24歲)→祥暻(1828,33歲) |
2회 |
|
|
朴陽慶 |
◦祥瓚(1834,27歲)→陽慶 |
2회 |
|
|
25 |
朴漢佐 |
◦漢春(1846,24歲)→朴漢佐 |
2회 |
|
26 |
朴崇穆 |
◦來穆(1861,16歲)→崇穆(1864,19歲) |
2회 |
 註33)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적류에 나타난 밀성박씨가의 노비 소유경향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10구 내외였다.
註33)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적류에 나타난 밀성박씨가의 노비 소유경향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는 10구 내외였다.
 註34)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노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60구를 넘나들게 되었다. 이 후 18세기 후반까지 60구 이상을 넘나드는 상당수의 노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비 소유 규모는 朴鼎淳대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18세기 말 박종근대에 이르러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초의 내시노비 혁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노비제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조선후기의 실상에 따른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비 소유 현황의 추이는 17세기 이후 마련되기 시작한 밀성박씨 종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은 18세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비록 분재를 통한 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반은 19세기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註34)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노비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60구를 넘나들게 되었다. 이 후 18세기 후반까지 60구 이상을 넘나드는 상당수의 노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비 소유 규모는 朴鼎淳대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18세기 말 박종근대에 이르러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초의 내시노비 혁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노비제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조선후기의 실상에 따른 역사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비 소유 현황의 추이는 17세기 이후 마련되기 시작한 밀성박씨 종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은 18세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비록 분재를 통한 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반은 19세기까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註35)
1895년(高宗32)에 작성된 문서로서 충청도 永春에 왕래하며 소요된 경비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1894년에 진행된 산송 과정에서 영춘에 정배되기에 이른 박숭목과 연관이 깊은 문서이다.
註35)
1895년(高宗32)에 작성된 문서로서 충청도 永春에 왕래하며 소요된 경비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다. 본 자료는 1894년에 진행된 산송 과정에서 영춘에 정배되기에 이른 박숭목과 연관이 깊은 문서이다.
 註36)
그 중 1626년(仁祖4) 密陽都護府 立案은 分財立案이다. 분재 서문에는 文忄+節의 처 박씨가 임진왜란 등의 난리 중에 아들을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다가 宗姪 朴範에게 의탁해 생활하였다. 그 후 그녀의 나이가 60을 훌쩍 넘고 건강도 좋지 못한 지경에 처하자 朴範과
朴箎註37)
에게 그녀의 사후 奉祀를 당부하면서 奴婢를 분재하게 되었다. 본 분재는 1626년 4월 19일에 있었으며 같은 달 21일에 박함이 밀양부에 입안발급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두달 후 6월에 財主 박씨에게는 公緘을
註36)
그 중 1626년(仁祖4) 密陽都護府 立案은 分財立案이다. 분재 서문에는 文忄+節의 처 박씨가 임진왜란 등의 난리 중에 아들을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다가 宗姪 朴範에게 의탁해 생활하였다. 그 후 그녀의 나이가 60을 훌쩍 넘고 건강도 좋지 못한 지경에 처하자 朴範과
朴箎註37)
에게 그녀의 사후 奉祀를 당부하면서 奴婢를 분재하게 되었다. 본 분재는 1626년 4월 19일에 있었으며 같은 달 21일에 박함이 밀양부에 입안발급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다. 두달 후 6월에 財主 박씨에게는 公緘을
 註38)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증인과 필집을 불러 초사를 작성한 후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본 문서는 분재기를 비롯하여 입안요청 소지, 공함, 초사를 모두 갖춘 완결된 형태의 문서이다.
註38)
통해 사실 확인을 하고, 증인과 필집을 불러 초사를 작성한 후 입안을 발급해 주고 있다. 본 문서는 분재기를 비롯하여 입안요청 소지, 공함, 초사를 모두 갖춘 완결된 형태의 문서이다.
 註39)
이에 인동부에서는 노비주와 증인을 불러 방매 사실을 확인한 후 동년 9월에 노비매매입안을 발급하였다.
註39)
이에 인동부에서는 노비주와 증인을 불러 방매 사실을 확인한 후 동년 9월에 노비매매입안을 발급하였다.
 註41)
박세경 등은 종회를 거쳐 박한춘으로서 종가를 계후하게 되었다.
註41)
박세경 등은 종회를 거쳐 박한춘으로서 종가를 계후하게 되었다.
 註42)
1603년의 분재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 상세하다. 전란 과정에서 가전 재산은 물론이고 문적을 분실하였으며, 특히 노비는 모두 도망하고 당시 한 구도 현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부득불 가전 전답 일부에 대해 朴範과 그의 孼弟 사이에 전답에 대해 분재를 이룩하게 되었다. 1615년의 분재기 또한 임란 후에 박범을 비롯한 그의 4娚妹간에 和會分財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1676년 분재기는 박의중의 母 廣州安氏가 아들의 무과 급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婢 2口, 奴 2口, 畓 15斗落, 田 20斗落을 별급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 기반의 재건에는 박범 이후 박의중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분재기의 분재 내용에 있어서도 노비와 전답의 분재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42)
1603년의 분재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이 상세하다. 전란 과정에서 가전 재산은 물론이고 문적을 분실하였으며, 특히 노비는 모두 도망하고 당시 한 구도 현존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부득불 가전 전답 일부에 대해 朴範과 그의 孼弟 사이에 전답에 대해 분재를 이룩하게 되었다. 1615년의 분재기 또한 임란 후에 박범을 비롯한 그의 4娚妹간에 和會分財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1676년 분재기는 박의중의 母 廣州安氏가 아들의 무과 급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婢 2口, 奴 2口, 畓 15斗落, 田 20斗落을 별급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 기반의 재건에는 박범 이후 박의중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분재기의 분재 내용에 있어서도 노비와 전답의 분재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註43)
註43)
 註44)
등 다양하다. 매매 대상물의 획득 과정은 명기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조상전래에 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註44)
등 다양하다. 매매 대상물의 획득 과정은 명기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나 조상전래에 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註45)
註45)
|
|
관 련 문 서 |
비 고 |
|
移買 |
6, ,9, 10, 24, 26, 28, 30 |
|
|
租稅納付 |
5,12,16,20,21,32 |
還上,三稅 |
|
凶年 |
3,7,8,11,15,16,20,25 |
春窮 |
|
生計 |
3,11,13,14 |
火變 |
|
私債償還 |
7,25 |
|
|
其他 |
35, 36 |
산지 소유권 관련 |
 註46)
향안 신규참여자는 향회에서 추천자에 의해 피망된 이후 향원들의 가부 의견을 물어 입록하였는데 이 때 否가 둘 이상이어도 입록이 보류되었다.
註46)
향안 신규참여자는 향회에서 추천자에 의해 피망된 이후 향원들의 가부 의견을 물어 입록하였는데 이 때 否가 둘 이상이어도 입록이 보류되었다.
 註47)
註47)
 註48)
본 향안의 기재 내용은 신향을 선출하는 내역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新鄕薦 혹은 新薦으로 구분하고 기존 향원이 새로운 향원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에 있어 1613년에서 1644년에 걸친 향회에서는 기존 향원에 의한 薦望의 원칙이 준칙되고 있으나 1645년 향회 부터는 別薦이라 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1652년 향회에서는 기존 향원이 두 명의 새로운 향원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별천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註48)
본 향안의 기재 내용은 신향을 선출하는 내역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新鄕薦 혹은 新薦으로 구분하고 기존 향원이 새로운 향원을 추천하고 있다. 추천에 있어 1613년에서 1644년에 걸친 향회에서는 기존 향원에 의한 薦望의 원칙이 준칙되고 있으나 1645년 향회 부터는 別薦이라 하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1652년 향회에서는 기존 향원이 두 명의 새로운 향원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별천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註49)
본 향안에는 밀성박씨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당시 밀양 향중에 있어 밀성박씨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다.
註49)
본 향안에는 밀성박씨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어 당시 밀양 향중에 있어 밀성박씨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다.
 註50)
註50)
 註51)
1689년의 종회를 기준으로 작성된 「密城朴氏宗契案」은 朴宜中을 중심으로 밀성박씨 종원이 참여하여 계금을 마련함과 아울러 享祀와 관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이와 유사한 종계의 운영에 있어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註51)
1689년의 종회를 기준으로 작성된 「密城朴氏宗契案」은 朴宜中을 중심으로 밀성박씨 종원이 참여하여 계금을 마련함과 아울러 享祀와 관련한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이와 유사한 종계의 운영에 있어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註52)
註52)
 註53)
위한 분전기를 비롯하여 덕남서원 운영과 관련한 자료가 중심이다. 서원운영 문서로는 각종 시도기와 朴翊影幀 봉안 관련문서, 그리고 書院錢 捧上記 등은 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이다. 이 외에도 시문류에는 덕남서원의 상량문을 비롯하여 서원 이건시의 상량문이 남아 있어 참고된다. 이들 자료는 덕남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 자료 전량을 수록하였다.
註53)
위한 분전기를 비롯하여 덕남서원 운영과 관련한 자료가 중심이다. 서원운영 문서로는 각종 시도기와 朴翊影幀 봉안 관련문서, 그리고 書院錢 捧上記 등은 서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서이다. 이 외에도 시문류에는 덕남서원의 상량문을 비롯하여 서원 이건시의 상량문이 남아 있어 참고된다. 이들 자료는 덕남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 자료 전량을 수록하였다.